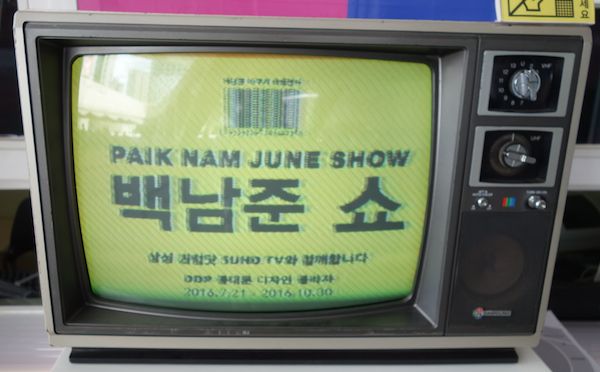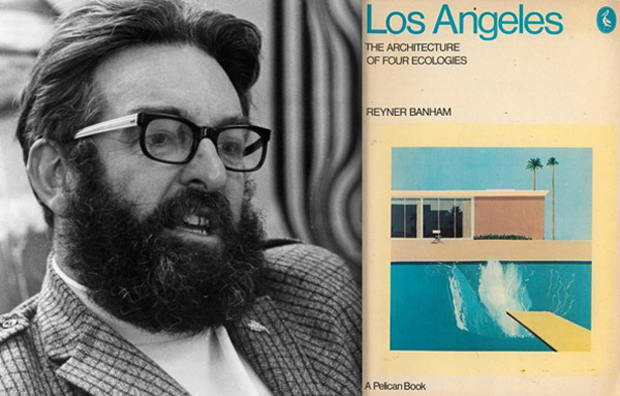나는 거의 매일 글을 쓰러 커피숍에 간다. 일주일마다 두 번 정도 가는 커피숍은 없지만 일주일마다 한 번씩 꼭 가는 커피숍은 몇 군대가 있다. 그 곳들 중에서 일본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씨를 테마로 한 피터캣이라는 북카페가 있다. 왜 카페가 그렇게 흔히지 않은 이름을 가지냐면 무라카미 씨 작가가 되시기 전 70년대에 도쿄에 있는 피터캣이라는 재즈바를 운영하셨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피터캣에서는 사장님이 어쩔 때는 재즈 음반을 틀고 어쩔 때는 무라카미 씨와 관련된 다른 음악을 튼다. 카페의 책장들에는 무라카미 씨가 쓰신 모든 책들을 찾을 수 있는데 무라카미 팬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작가들이 쓴 책도 있다.
모든 나라에 있는 독자들은 현재 세계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소설가일 수 있는 무라카미 씨의 작품들을 즐긴다. 나는 일본어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인 12년 전에 무라카미 씨의 소설을 처음으로 읽었다. 베스트셀러였던 “노르웨이의 숲”을 읽으면서 그 1960년대의 일본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 평범한 것과 이상한 것이 섞여 있는 분위기는 내 관심을 사로잡았다. (“노르웨이의 숲”은 한국에서 원래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그 후로 나는 무라카미 씨가 쓰신 다른 소설들을 찾아서 읽었다. 피터캣의 사장님도 포함될 수도 있는 대부분의 무라카미 씨의 팬들은 앞서 말한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무라카미 씨가 쓴신 작품들이 왜 그렇게 인기가 엄청난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지만 결국에는 그의 소설을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독자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이유로 피터캣 같은 무라카미 씨를 테마로 한 모임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피터캣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잘 하지 않은 편이고 주로 혼자 음료를 마시면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다. 여자친구와 같이 올 때도 있는 내 경우에는 몇 시간 동안 여자친구와 나란히 앉아서 그런 조용한 시간을 보낸다.
무라카미 씨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자주 혼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도시의 길를 걸어다니거나 요리를 하는 등 피터캣에 오는 손님들처럼 비슷하게 생활한다. 나는 무라카미 씨가 쓰신 에세이 책들을 읽음으로써 무라카미 씨도 그런 사람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무라카미 씨가 쓰신 많은 에세이 책의 대부분을 읽을 수 없었다. 왜 일본인 작가가 쓴 책들을 읽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었냐면 무라카미 씨가 쓰신 모든 소설들은 영어로 꼭 번역이 되지만 그의 대부분의 에세이 책들은 거의 영어로 번역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어로 된 글은 영어보다 한국어로 훨씬 쉽게 번역될 수 있어서 무라카미 씨가 쓰신 모든 글들을 한국어로 읽을 수 있다.
앞서 말한 피터캣에는 무라카미 씨의 모든 글을 다 소장하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그의 책을 읽을 수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한국어 읽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피터캣의 책장들에 보관되어져 있는 무라카미 씨와 관련된 책들을 다 읽고 싶어졌다. 피터캣에는 무라카미 씨가 쓰신 에세이 책과 재즈에 대한 책과 여행기 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이 쓴 무라카미 씨에 대한 책들도 있다. 그 책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인 작가가 쓴 무라카미 씨와 연관된 레시피 책이다. 그 책의 표지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에서 꺼낸 위로의 요리들”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내가 그 책들을 다 읽고 싶으면 피터캣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할 지도 모르겠다. 다행히도 거기에서는 오전에는 리필이 가능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오후에는 무라카미 씨가 제일 좋아하시는 음료인 맥주를 마실 수도 있다. 하지만 피터캣에서는 나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독자를 많이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라카미 씨의 독자들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 무라카미 씨가 쓰시는 이야기들은 전통이 약해져 가고 국경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인식 되어 가는 21세기의 현실과 어울린다.
무라카미 씨가 쓰신 책들은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 있어서 어떠한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친구가 나에게 어느 작가의 책을 읽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나는 항상 무라카미 씨가 쓴 책을 추천한다. 재즈 뿐만 아니라 야구와 탐정 소설에도 큰 관심이 있는 무라카미 하우키 씨가 쓰신 책들은 미국인인 나에게도 미국 문화를 이해하는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나는 무라카미 씨가 쓰신 소설들의 스페인어 번역본을 읽을 때는 스페인어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요즘 한국어 번역본을 읽으면서는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길목에 서 있는 것 같다. 나는 언젠가 원래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쓰신 일본어로 된 책을 읽게 될 그 날을 희망해 본다.